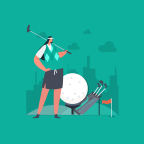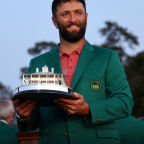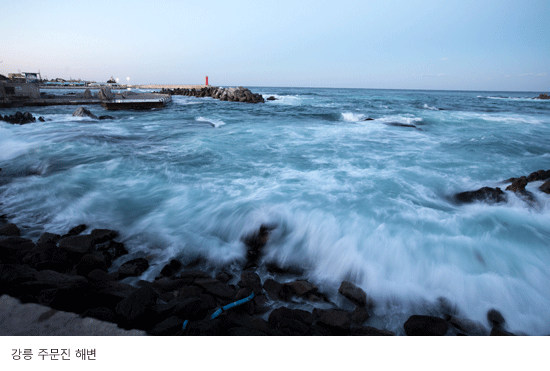











 동틀 녘, 강원도 속초 속초항에서 바라본 동해 바다. 만선의 꿈을 실은 고깃배가 출어에 나서고 있다.
동틀 녘, 강원도 속초 속초항에서 바라본 동해 바다. 만선의 꿈을 실은 고깃배가 출어에 나서고 있다.
week&이 강원도 속초와 강릉으로 겨울 맛 기행을 떠났다. 다른 바다 다 놔두고 굳이 동해안으로, 그것도 북쪽 포구로 나선 이유가 있었다. 차가운 물줄기를 따라온 물고기들이 동해 중북부 바다에서 노닐고 있어서다. 물 만난 고기 덕에 갯마을은 들썩거렸다. 어부들은 부지런히 그물을 부렸고 아낙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물에 걸린 고기를 떼어냈다. 경매를 치른 갯것은 난전으로, 다시 식당으로 팔려갔다. 동해 겨울 별미에는 갯가 사람의 손맛이 배어 있었다.
도루묵과 양미리 겨울 동해 바다의 주인공
 양미리. 도루묵과 함께 겨울 동해바다의 맛을 책임진다.
양미리. 도루묵과 함께 겨울 동해바다의 맛을 책임진다.도루묵과 양미리는 늘 붙어다니는 이름이다. 잡히는 시기가 비슷해서다. 머릿수로만 따지면 10월부터 1월까지 동해 바다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도루묵과 양미리다. 생김새는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도루묵이 조기처럼 도톰한 편이라면 양미리는 장어처럼 늘씬하다고 할 수 있다.
양미리의 본래 이름은 ‘까나리’다. 그러나 동해안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없다. 강릉 사천항 어민들도 그렇다. 전국 양미리 물량의 절반이 이곳에서 잡힌대도, 양미리는 양미리일 따름이다. 사천항에서는 11월부터 1월까지만 양미리 조업을 한다. 강릉 사천진리 박성호(62) 이장은 “양미리는 여름 내내 동해 바다 밑바닥 모래 속에서 여름잠을 잔다. 날씨가 추워지면 산란하러 연안으로 올라온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사천항에서 만난 박순남(76) 할머니도 양미리와 함께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할머니는 “20년 전부터 양미리를 그물에서 떼내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작업 시간은 첫 배가 들어오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10ℓ 들이 고무통 1개에 양미리를 채우면 보통 4000원을 쳐준다. 할머니는 그날 고무통 20개를 채워 8만원을 벌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양미리는 “고맙고 기특한” 맛이 난다. 사천항 근처 난전에서 파는 양미리 구이를 베어 물었다. 고맙고 기특하고 또 고소했다.
 주문진항 먹자 골목에서 파는 도루묵구이.
주문진항 먹자 골목에서 파는 도루묵구이.도루묵을 맛보러 강릉 주문진항으로 향했다. 주문진항 주변의 식당은 대부분 도루묵을 다룬다. ‘줍는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도루묵이 많이 잡혀서다. 지난해 강릉 주문진항 위판장에서 거래된 도루묵만 약 400t에 이른다. 오전 8시에 맞춰 주문진항에 가니, 도루묵이 꽉 찬 그물을 내려놓는 어선들로 포구가 가득했다. 어시장 상인들의 외침도 요란했다.
“도루무기 사기요. 암놈이 20마리 만원, 수놈은 100마리 만원.”
싸다고 해서 수놈을 집어가는 여행객은 없었다. 지금이야말로 산란을 앞두고 알을 꽉 채운 ‘알배기 도루묵’을 맛볼 때이어서다. 주문진항 주변 ‘중앙집식당’에서 연탄불에 구운 도루묵구이와 맵게 양념한 도루묵찌개를 맛봤다. 오톨도톨한 도루묵 알을 한입 베어 물고 야무지게 씹었다. 두고두고 생각날 만큼 담백한 맛이 퍼졌다.
도치 맛은 외모 순이 아니다
 허연 배를 드러낸 도치.
허연 배를 드러낸 도치.동해에서 못생긴 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물고기가 있다. 도치다. 갯가에서는 ‘심퉁이’라고도 한다. ‘심술 맞게 생긴 그 생선’이라고 하면 그제야 ‘아!’ 하고 무릎을 탁 치는 사람도 있다.
도치는 복어처럼 동글동글한 바닷고기로 12월부터 동해안 중북부에서만 난다. 등은 새카맣고 배가 허옇다. 배의 절반이 빨판이다. 빨판의 힘에 의지해 바위에 딱 달라붙어 산다. 사시사철 잡히지만 하필 지금 도치를 들먹이는 까닭이 있다. 2월에 산란을 앞두고 가장 맛있는 때라 그렇다.
지난해 12월30일 새벽 6시. 강원도 속초 동명항에 하나 둘 고깃배가 들어왔다. 배에서 내리는 생선의 절반이 도치였다.
도치는 명실공히 명태가 떠난 동해 바다의 겨울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도치를 푸대접했던 어민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다. 어민 최동근(45)씨가 “구멍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써서 도치 잡은 그물은 매일 손을 봐야 한다”고 이유를 댔다. 세숫대야만한 고무통을 가득 채워도 1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값도 도치에 대한 구박을 거들었다.
동명항에 올라온 도치는 모조리 동명항 회센터로 팔려갔다. 동명항 위판장 18호 중매인 최순회(52)씨가 운영하는 ‘신흥수산’으로 들어갔다. “알 품은 암컷은 탕으로, 수컷은 회로 먹으라”는 최씨의 조언에 따라 수조에서 큼지막한 수컷을 골랐다. 조업량에 따라 매일 시세가 달라지는데 12월 초에는 3마리에 만원, 이날은 1마리에 만원이라 했다.
살이 질긴 도치는 날것으로 먹을 수 없다. 대신 내장을 제거하고 뜨거운 물에 두어 번 헹구니 쫄깃쫄깃한 숙회가 됐다. 식감이 탱글탱글한 젤리를 씹는 것 같았다. 비리지 않고 담백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맛은 외모 순이 아니었다.
장치 뱃사람의 맛
 강원도 속초 동명항. 활어만 거래되는 포구다.
강원도 속초 동명항. 활어만 거래되는 포구다.다시 못생긴 이야기를 해야 한다. 동해에는 ‘치’를 돌림자로 쓰는 못난이 삼 형제가 있다. 못난 계보를 잇는 것이 도치·곰치(꼼치) 그리고 장치다. 장치의 본래 이름은 ‘벌레문치’다. 어른 팔뚝보다 긴 생김새를 보니 본명보다 별명이 입에 감긴다. 갯가에서는 누구나 장치라고 부른다. 장치도 12월부터 2월이 제철인데, 이때 잡히는 것이 가장 기름지다. 겨울이라고 어획량이 특별히 느는 건 아니다. 연안에 친 그물에 한두 마리 딸려오는 식이다. 동명항 어판장에서 몸길이가 50~60㎝ 되는 장치 3마리가 10만원에 팔렸다.
 동명항 경매 현장.
동명항 경매 현장.바닷가에서는 장치를 잡아서 그대로 먹는 법이 없다. 잡자마자 내장을 제거하고 사나흘 해풍에 말린다. 장치 전문식당인 ‘야!삼정식당’은 아예 자체 덕장을 두고 있는 집이다. 뒤뜰에 걸린 장치 30여 마리가 바닷바람을 쐬고 있었다. 이틀이면 다 팔릴 양이다. 장치는 동명항에서 활어로 떼 오고, 모자라면 속초 중앙시장에서 선어를 사다 쓴다. 17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김상재(64) 사장에 따르면 장치는 원래 뱃사람들이나 먹던 음식이었다.
“날로 먹으면 특유의 노린 맛이 나서 아무도 손대지 않던 고기였지요. 한데 뱃머리에 걸어 말린 장치를 끓여 먹으니 그 어떤 생선보다 맛이 좋았다고 뱃사람이 일러주더군요.”
말린 장치는 생긴 건 북어와 비슷해도 풍미가 훨씬 깊다. 속살은 명태를 반건조한 ‘코다리’처럼 말캉했다. 얼큰한 장치찜 국물에 밥을 쓱쓱 비벼먹었다. 어느새 2인분 양을 혼자서 비웠다.
문어와 가자미 겨울에 더 차지는 맛
 한 어민이 갓 잡아온 물가자미를 해풍에 말리고 있다.
한 어민이 갓 잡아온 물가자미를 해풍에 말리고 있다.어느 포구에서든 ‘무네(문어)’를 잡은 어부는 흐뭇하다. 내놓기 무섭게 1㎏에 4만원을 웃돌 정도로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이다. 문어는 잡식성이자 바다의 상위 포식자다. 개체수가 적고 수요는 많으니 갈수록 귀해지고 있다. 겨울 문어가 특히 더 맛있다는 걸 갯마을에서는 다 안다. 해서 문어는 제철에 값이 더 뛴다.
문어가 아무리 비싸도 강릉에서는 혼례 상에 문어를 반드시 올린다. 문어 요리법도 다른 지역과 조금 차이가 있다. 강릉식으로 문어를 다룬다는 ‘해랑’이란 식당을 찾아갔다. 홍인표(44) 주방장이 “겨울에 더 향긋해지는 문어 맛을 느끼려면 문어숙회보다 문어초회가 낫다”며 권했다. 강릉시청 최규선(44)씨도 “문어초회는 강릉 대갓집에서 제사상에 꼭 올리는 음식”이라며 거들었다. 문어를 삶아 어슷하게 썰어내는 것은 문어숙회와 같다. 여기에 채소를 썰어 넣고 조선간장과 양조간장, 들기름을 쳐 무쳐낸다. 질겅거리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문어가 부드럽게 씹혔다.
 문어는 겨울 바다의 황금이다. 1㎏에 4만원이 넘는다.
문어는 겨울 바다의 황금이다. 1㎏에 4만원이 넘는다.겨울 동해안에서 가자미도 빠질 수 없다. ‘봄 가자미’라는 말이 있지만, 동해안에서는 육질이 단단해진 겨울 가자미를 으뜸으로 치기도 한다. 지금의 속초 ‘아바이마을’에 정착한 실향민들이 특히 그랬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을 따라 내려와 다시 고향으로 가지 못한 이들이 이북 음식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있었다.
그들이 김치처럼 즐겨먹는 음식이 ‘가자미식해’다. 마시는 ‘식혜’가 아니다. 갯것으로 만든 이북식 젓갈이다. 아바이마을 노인회관에서 만난 송수학(76) 할아버지는 “겨우내 담근 가자미식해가 가장 쫄깃쫄깃하고 맛있다”고 말했다. 속초 시내 식당에서는 가자미식해를 찬으로 낸다. 하지만 대부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것이라 보면 된다. ‘김송순 아마이젓갈’의 김송순(87) 할머니는 실향민 사이에서도 제 맛을 지키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가자미식해는 겨울에 담가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조금씩 꺼내먹는 거야. 2~3년 전인가, 탈북자 가족이 찾아왔지. 고맙다며 젓갈 한 통 사 가데. 내심 뿌듯했지.” 차디찬 동해 바다에서 건져 올린 따스한 맛이었다.
글=양보라 기자




![딸아, 세상의 반이 노인 된다…자산 900% 불린 ‘전원주式 투자’ [고령화 투자대응②]](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6/ebfb7a68-55ea-4e4b-a446-d2f93b51411e.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