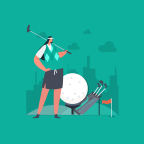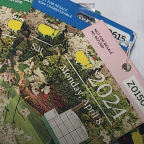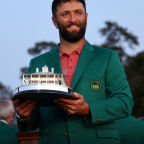정철근
정철근논설위원
“엄마에게 줄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 죄송해요. 회사 윗분들이 2년이 지나면 정식 직원으로 전환해 준다고 약속했으니 조금만 참으세요.”
권모(25)씨는 136만원의 월급 중 일부를 생활비에 보태며 어머니에게 항상 미안해했다고 한다. 권씨는 자라면서 걱정 한번 안 끼치게 했던 효녀였다. 인천지역 사범대를 최우등생으로 조기졸업하고 한 경제단체에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밤엔 서울 명문 사립대 석사과정을 다녔다.
그러던 권씨가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해고하자 그 배신감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그는 비록 계약직이긴 했지만 열심히 일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CEO 스쿨에서 보조업무를 하면서 회식자리에도 빠짐 없이 참석했다. 권씨의 성실성을 높게 평가한 회사 간부들은 그가 그만두려 할 때마다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며 붙잡았다. 한 선배는 그를 옥상으로 불러 “이제 한 배를 탔으니 나를 OO씨라고 부르지 말고 선배라고 해”라고까지 말했다.
그런데 CEO 스쿨에 다니는 한 중소기업 사장의 성추행·성희롱을 회사 측에 알린 게 화근이 됐다. 중소기업 사장은 회식 자리에서 블루스를 추자고 하는 등 권씨를 괴롭혔다. “나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아. XXX 해야겠네. 근데 XXX가 뭔지 알아.” 그 사장은 딸 뻘인 권씨에게 성관계를 뜻하는 속어를 내뱉으며 희롱을 했다. 하지만 회사 간부들은 권씨가 성추행을 보고한 이후 오히려 싸늘하게 변했다. 결국 그는 지난 8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는 2년이 지나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거나 해고해야 한다.
권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다. 그런데 회사 간부들이 문서가 아닌 말로 약속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오죽하면 그는 “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겠다”며 신림동 고시학원에 등록해 공인노무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다. 그는 “너무 억울해 공부도 안 된다”며 자주 울었다. “딸이 성추행을 털어놓았을 때 내가 그만두라고 했어야 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통화 내내 차분하게 말하던 권씨의 어머니는 끝내 오열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최근 펴낸 사회통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비정규직이 3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22.4%에 불과하다. 비교 대상 OECD 16개 국가 중 가장 낮다.
문제는 고용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 구직자들이 한번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인터넷엔 대학을 졸업한 뒤 수년째 고시원에서 숙식하며 낮엔 계약직이나 일용직을 전전하고 밤엔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88만원 세대’들의 슬픈 사연이 숱하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TV 드라마 ‘직장의 신’에서 정주리(배우 정유미 분)는 지방대 출신에 영어도 잘 못하는 이른바 ‘스펙’이 약한 대졸 구직자다. 정주리의 면접 장면은 계약직 채용에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시대 젊은 구직자들의 절박함이 녹아 있다.
정주리 : 제가 맵지도 짜지도 않은 메주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된장·고추장을 만드는) 이 회사에서 잘 묵혀 나가겠습니다.
면접자 : 똥일지 장일지 모르는 메주를 우리 회사에서 묵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주리 : 똥일지 장일지는 묵힌 다음에 찍어 먹어봐야 아시는 거죠.
그렇다. 똥이 될지 장이 될지는 일단 묵혀 봐야 하는데 많은 청년들에겐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올해 경기 침체로 100대 기업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결국 많은 젊은이가 권씨처럼 정규직 전환의 희망을 품으며 차선책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것이다. 비정규직이 계급으로 고착화된 사회. 그 속에서 꿈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기업이나 국가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 권씨의 비극을 단편적인 사건으로 넘길 게 아니라 현 시스템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정철근 논설위원

![[오늘의 운세] 4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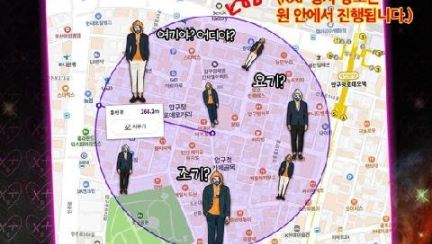
![[단독]"강남좌파, 조국당 갔다"…부자동네 표, 민주연합에 앞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e795ba60-3ccf-4eee-b4d1-91c27579509f.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이준석 “나를 싸가지 없는 괴물 만들어…그게 오히려 당선 기여” [22대 국회 당선인 인터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4eb7a7f1-2218-4315-a95f-60b570d0d723.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