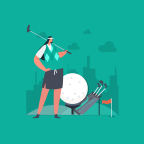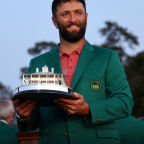교육감 선거의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의 압승을 보수 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투표용지의 잉크도 채 안 말랐는데 벌써 직선제 폐지론이 나온다. 우선 그 얘기부터 들어보자.
“교육 자치제도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교육행정 집행기관이 자치단체와 교육감으로 이원화돼 있고, 의결·견제 기능은 지방의회에 통합돼 있는 모순이 있다. 이는 통합도 아니고 분리도 아닌 기형적인 제도로 작용해 왔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의 교육자치소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안을 확정하고 내놓은 설명이다. 이렇게 어정쩡한 제도를 바로잡으려면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이런 얘기는 어떤가.
“교육감은 직선제로 모든 지역 주민들이 뽑는 게 옳다. 그것은 교육자치의 원리 중에 이른바 주민통제의 원리라고 하는 원칙에 맞다. 즉 모든 납세자가 투표권을 갖는 게 맞다는 측면에서 직선제로 가야 한다.”
직선제 고수를 주장하고 있는 진보 쪽 얘기가 아니다. 교총 회장을 지낸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2006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 직선제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한 주장이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본회의에서도 반대토론 없이 통과됐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이시종 의원만이 반대 발언을 했을 뿐이다.
“1991년부터 지속돼온 현행 교육감 간선제를 졸속 처리해 개악하는 것보다는 미흡하지만 당분간 유지해가면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옵니까?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교육위 간사였던 임해규 의원은 직선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자찬하기도 했다. 그런데 왜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쪽의 직선제 소신이 바뀐 걸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말이다.
그들이 가장 앞세우는 논리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같이 선거를 하다 보니 교육감에 대한 시민 관심이 적어 적임자를 구분 못 하는 ‘깜깜이 선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지난 선거에서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표가 더 많았음에도 결과는 단일화에 성공한 진보 후보들에게 패했다는 억울함이 묻어난다. 선출된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 유권자들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과잉대표’라는 얘기다.
그런데 만약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성공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보수 후보들이 얻은 표들이 단일화됐어도 고스란히 보수 쪽으로 흘러갔을 거라고 믿는다는 건가. 그렇다면 이번 선거가 ‘깜깜이’ ‘로또’ 선거였다는 스스로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니라면 유권자를 언제나 내 편인 그야말로 ‘호구’로 보는 오만함이 아닐 수 없고 말이다.
설령 이번 패배가 단일화 실패 탓이라 쳐도 그것은 곧 진보 측에 비해 교육개혁에 대한 절실함이 적었다는 방증 아닌가. 그러니 “축구를 하다 지니까 축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진보 쪽 비아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다.
교육감을 임명제 또는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로 한다는 건 백년대계여야 하는 교육이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시대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임명제에서 간선제로, 또 직선제로 바뀌어온 게 아니었던가. 교육정책 논의가 여전히 보수·진보의 진영논리에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지만 과거 임명제나 간선제 시절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도 유권자들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걸 다 양보한다고 해도 직선제 폐지 주장을 꺼내 들려면 적어도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게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터다. 패배의 미덕은 판을 깨는 게 아니라 그 판에 다시 들어가 조금이라도 나은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패배를 극복하고 새로운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길이다.
남북전쟁 때 애포머톡스 전투에서 패한 뒤 “숲으로 달아나 게릴라전을 벌이자”는 제안을 물리치고 항복한 남군의 리 장군도, 해하의 결전에서 유방한테 패한 뒤 “고향으로 돌아가 후일을 도모하자”는 권유를 뿌리치고 자결을 택한 항우도 그랬다. 치유 불가능한 분열을 막고 더 나은 미래라는 대의를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라도 살고 그들 스스로도 영웅으로 역사에 남은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600만 초·중·고생은 물론 그들이 세상의 주역이 될 미래가 놓여 있다. 어찌할 것인가.




![딸아, 세상의 반이 노인 된다…자산 900% 불린 ‘전원주式 투자’ [고령화 투자대응②]](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6/ebfb7a68-55ea-4e4b-a446-d2f93b51411e.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