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사이버자야에 있는 한화큐셀 공장에서 한 여직원이 태양전지 제품을 분류하고 있다. [사진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사이버자야에 있는 한화큐셀 공장에서 한 여직원이 태양전지 제품을 분류하고 있다. [사진 한화큐셀]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남서쪽으로 30여㎞ 떨어진 정보기술(IT) 산업단지 ‘사이버자야(Cyberjaya)’. 독일의 태양전지 업체인 큐셀이 이곳에 공장을 완공한 것은 2011년이다. 지난해 9월 큐셀 인수 검토를 위해 사이버자야에 파견됐던 한화큐셀 이관석 기술기획팀장은 쾌재를 불렀다. 그는 “(큐셀이) 파산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기술과 품질은 오롯했다”며 “밀림 한가운데서 ‘태양광의 황제’를 발견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1년, 지난 12일 찾은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공장은 활력이 넘쳐났다. 높이 4m쯤 되는 지붕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가로·세로 15.2㎝(6인치) 정사각형 모양의 웨이퍼를 담은 박스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원재료인 웨이퍼 검사부터 세척, 표면 처리, 품질 검사까지 모든 공정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물류자동화시스템(AMHS)이다. 웨이퍼가 AMHS를 따라 2.3㎞짜리 공정을 거치면 태양광을 전기로 바꿔주는 소자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다수의 중국 업체는 아직 반(半)자동 공정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 류성주 법인장은 “자동화 덕분에 불량률이 세계 최저인 평균 0.0025%를 유지하고 있다”며 “경쟁사 제품보다 10~20% 프리미엄을 받는데도 주문이 늘고 있어 증설을 검토 중”이라고 자랑했다. 이 공장의 올해 예상 생산량은 917㎿, 숫자로 따지면 2억 장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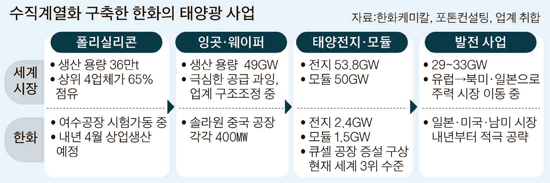
1년 만에 이 같은 성과를 거둔 데 대해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는 “독일에서 전략·연구개발(R&D)을, 사이버자야 공장에서 생산을, 한화가 시장 개척을 맡는 3각 구도가 시너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은 한화큐셀과 한화솔라원(옛 솔라펀)을 기반으로 2015년 태양광 세계 1위에 도전하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내년 4월 상업 생산을 목표로 폴리실리콘 공장을 짓고 있다. 큐셀은 터키와 칠레·태국 등에서 발전사업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메이저 업체 중 유일하게 태양광 수직계열화를 이루는 셈이다.
성공 여부는 태양광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햇빛을 보느냐’에 달렸다. 태양광산업은 2008~2012년 연평균 52%씩 성장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던 유럽 정부가 재정위기를 겪고, 업체 간 공급 과잉이 극심해지면서 한순간에 고꾸라졌다. 한화는 ‘과감한 진격’ 전략을 선택했다. 지금까지 태양광에 투입한 자금은 2조원가량. 특히 김승연 한화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략마케팅실장이 인수 후 4차례 말레이시아 공장을 찾을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성적표는 ‘아직은’이다. 한화는 태양광사업에서 지난해 7393억원, 올해 2분기까지 774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영업적자는 각각 2527억원, 618억원이었다. 2010년 솔라원이 1000억원대 영업이익을 낸 것이 유일한 흑자였다. 신성솔라에너지 기술연구소장을 지낸 고려대 이해석(신소재공학) 교수는 “큐셀 인수로 한화는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시장이 회복되면 선두 기업으로 치고 올라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너의 부재 역시 걸림돌이다. 김 대표는 “태양광사업은 각국 정부와 토지·보조금 등을 논의해야 하는데 김승연 회장의 부재로 공격적인 투자가 중단되기도 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사이버자야(말레이시아)=이상재 기자



![건강도 상속도 챙겨준다…‘보증금 3000만원’ 실버타운 가보니 [고령화 투자대응④]](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8/e7b3f20b-7814-49a9-8dca-d6f7cfb4c4c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