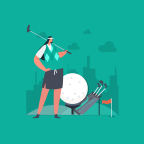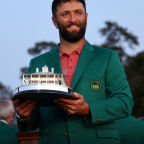강갑생
강갑생JTBC 사회 1부장
말 그대로 눈 뜨면 폭염, 눈 감으면 열대야다. 남부 지방은 40도 가까운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열대야 역시 며칠째인지 세기도 헛갈린다. 제주 서귀포시는 거의 40일째 계속되고 있다. 낮 동안 폭염에 지친 체력을 편한 밤잠으로 보충해야 하는데 열대야가 훼방을 놓기 일쑤다. 이젠 친숙하기까지 한 열대야(熱帶夜)는 본래 일본에서 만들어진 기상용어다. 일본의 기상 수필가인 구라시마 아쓰시가 고안한 단어라고 알려져 있다. 하루 중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의미했다. 우리 기상청에선 야간의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현상으로 조금 달리 정의한다.
최근 무척 생소한 용어가 등장했다. 바로 초(超)열대야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무려 30도를 넘는 걸 말한다. 공식용어는 아니지만 역시 ‘열대야’를 만든 구라시마가 작명했다고 한다. 우리 사전엔 ‘방 밖의 온도가 섭씨 25도보다 훨씬 더 높은, 아주 무더운 밤’이라고 풀이돼 있다. 이 단어는 상당 기간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열대야는 있어도 초열대야 수준으로까지 기온이 올라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결국 이 단어를 써야만 했다. 강릉의 밤사이 최저기온이 30.8도를 기록했다. 다음 날엔 31도나 됐다. 남의 나라 얘기로만 알았던 초열대야가 이젠 우리나라 얘기가 된 것이다. 사실 초열대야만 골칫거리가 아니다. 요즘 낮 최고기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울산에선 얼마 전 공식기록은 아니지만 자동관측장비가 40.3도를 표시한 바 있다. 일본·중국 등지에서 전해오는 40도 넘는 강력한 폭염 소식이 우리에게도 가까워지는 느낌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기후 변화에 맞설 준비가 돼 있느냐다. 답은 부정적이다. 최근까지 국내에선 7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대부분 소규모 공사장의 인부거나 농촌 지역 노인들이다. 뜨거운 한낮에 가급적 작업을 피하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라는 안전 수칙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하지만 소규모 공사장에서 그런 수칙은 관심 밖이다. 지키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다. 권고 사항이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한낮에 하는 밭일도 마찬가지다. 누구 하나 말리지 않는다. 순찰을 돌며 열사병 위험을 경고하는 읍·면 사무소 직원이나 경찰관을 찾아보기 어렵다. 더위에 지친 노약자들이 쉬어 가라고 지정해 놓은 무더위 쉼터도 예외는 아니다. 전기료 아낀다며 에어컨을 꺼놓는 곳도 적지 않다. 사회 안전망 곳곳이 구멍이다.
일본처럼 사회 응급 구조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는 나라에서도 기록적 폭염 앞에선 사망자가 속출한다. 만일 일본 수준의 더위가 우리에게 닥쳤다면 어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태풍·홍수만이 무서운 재난이 아니다. 이젠 폭염과 열대야도 재난 수준으로 다뤄야 한다. 그에 걸맞은 안전망과 응급 구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기후 변화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우리 생명이 달려 있다.
강갑생 JTBC 사회 1부장



!["상처받았다"는 전공의, 월급 끊긴 간호사와 환자 상처도 보라 [현장에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6/ae147254-79ab-4abf-8f36-504f36f57bc3.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이준석 “나를 싸가지 없는 괴물 만들어…그게 오히려 당선 기여” [22대 국회 당선인 인터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4eb7a7f1-2218-4315-a95f-60b570d0d723.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