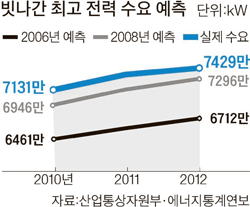
3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준비’라는 문구가 일제히 발송됐다. 이날 전력 수요가 6259만㎾대까지 오르면서 예비전력이 429만㎾ 중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준비’는 전력 경보인 ‘준비-관심-주의-경계-심각’ 가운데 첫 단계. 예비전력이 400만㎾대로 하락할 때 발령된다. 이날 서울 낮 온도가 28도에 불과했지만 벌써 전력대란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은 용량 100만㎾짜리 원자력발전소 한두 기만 고장 나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에 빠질 수 있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그래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윤상직 장관은 산업계에 “전력을 덜 써달라”고 부탁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낮 12시에는 ‘비철금속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 오후 2시엔 ‘전력수급 관련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전기 절약을 요청했다.
전력대란은 위조 부품으로 인한 원전 정지 탓만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게 있다. 빗나간 정부의 전력 수요 예측이다. 산업부는 보통 2년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내놓는다. 2006년 말에는 2012년 최대 전력 수요를 6712만㎾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수요는 7429만㎾였다. 예측치보다 717만㎾(10.1%)나 많았다. 이는 원전 7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이다. 2008년 말에 전망한 2012년 예측치도 7296만㎾로, 실제 수요에 훨씬 못 미쳤다. 2010년 말이 돼서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발전소 건설은 10년 이상 내다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각종 인허가와 주민 동의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다. 보통 화력은 7년, 원자력은 10년 이상 걸린다. 산업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15년 뒤까지 전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산업부의 장기(7년 이상) 수요예측은 15%나 차이가 나기도 했다. 이렇게 수요를 적게 예측한 탓에 한국은 지난 3년간 전력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2009년 전력 예비율(공급 능력 기준)이 14.9%로 넉넉했지만, 2010년 6.4%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3.8%로 반 토막이 났다. 그런데 산업부는 전력이 부족할 때마다 날씨 탓만 했다. 2011년 9·15 정전 때는 이상고온, 2012년 2월엔 30년 만의 2월 한파를 이유로 들었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는 과거 전력 수요를 토대로 미래 수요를 추정한 뒤 정부가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양을 빼 수요 예측치를 산정한다”며 “하지만 과거 수요치는 이미 정부가 전력사용을 억제한 뒤의 ‘관리 후 수요’여서 사실상 정부의 ‘수요 관리’분을 두 번 빼게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박성택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 과거 계획에서 수요 관리 부분을 지나치게 낙관해 발전소 물량이 적게 계산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서균렬(원자핵공학) 교수는 “공급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정부는 자꾸 수요 관리로 가려 한다”며 “수요 관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