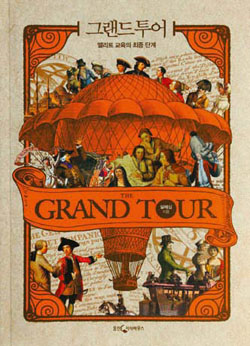 저자: 설혜심 출판사:웅진지식하우스 가격: 2만3000원
저자: 설혜심 출판사:웅진지식하우스 가격: 2만3000원 20년 전쯤 우리나라에도 배낭여행 붐이 일었다. 대학생들은 방학이면 한두 달씩 유럽으로 떠났다. 돌아온 이들에겐 다음 수순이 기다리고 있었다.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어학 연수였다. 기간도, 비용도 훌쩍 늘어난 건 당연했다.
『그랜드 투어』
신기하리만큼 똑같은 현상이 이미 18세기에도 성행했다. 이른바 ‘그랜드 투어’였다. 유럽의 10대 청소년들이 교육을 목적으로 프랑스·이탈리아 등을 2~3년씩 누비는 것을 뜻한다. 17세기 후반 종교 분쟁이 가라앉고 산업화로 경제적 여유가 생긴 영국 상류층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궁극의 엘리트 교육’으로서 자녀의 해외 문화 체험을 생각해 냈다.
지금도 웬만한 교육열이 없으면 힘든 게 ‘교육 여행’이다. 그렇다면 그 10대들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얻었을까. 연세대 설혜심(사학과) 교수는 이에 대한 세세한 답변을 책으로 펴냈다. 책은 여행자들이 부모와 주고 받은 편지, 동행 교사가 남긴 글 같은 개인적 기록부터 당시 신문 사설, 여행 지침서 등 공적인 기록을 세심히 추적했다.
읽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마치 평행 이론이 적용되듯 현재 우리 교육현실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다. 지금의 조기 유학처럼 당시의 그랜드 투어의 계기도 공교육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놀랍다. 명문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이 당시엔 진부한 커리큘럼으로 부모들의 불만을 샀다. 고리타분한 라틴어나 배우는 대학보다는 역사·철학·시 같은 ‘실용적 학문’과 승마·춤·펜싱 등 예체능까지 섭렵할 수 있는 ‘사교육 여행’이 부모들을 유혹했다. 무엇보다 외국어(대부분 프랑스어)를 배우는 데 현지 연수가 최고라는 데는 동서고금 부모 마음이 얼마나 똑같은지!
물론 비용은 지금에 비하면 상상초월이다. 개인 식기, 이동용 목욕통까지 챙겨가는 어마어마한 짐은 물론이요, 하인들과 동행 교사까지 한 그룹으로 다녀야 했으니 말이다. 거기다 파리에선 옷, 이탈리아에선 각종 미술품, 네덜란드에선 책을 쇼핑하고, 오페라나 사교 모임까지 즐기다 보면 1년에 지금 돈으로 40만 파운드(약 6억5000만원)나 되는 돈이 들었다.
투자 대비 효과가 나타나면 그나마 다행. 해외 유학의 효용성에 답이 갈리듯 그랜드 투어의 결과도 개인에 따라 달랐다. 대문호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 이후 고전『이탈리아 기행』을 남겼다면, 세계의 지성으로 꼽히는 론 로크는 옷값으로 경비를 탕진했고 루소는 연애 스캔들에 휩싸였다. 매일 밤 술과 여자에 취해 방탕아로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처럼 여행의 효용성은 개인의 문제였으나 ‘그랜드 투어’라는 사회적 현상은 후대에 많은 것을 남겼다. 각국 출신 명사들이 현지에서 만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지성인들이 남긴 책은 후대에 고전이 됐다. 당시 동행 교사로 떠났던 애덤 스미스가 무료함을 이기지 못해 쓴 책이 바로 『국부론』이요,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 남긴 책이『로마제국 쇠망사』다. 여행 가이드는 하나의 책 장르가 됐으며, 그룹으로 움직이는 패키지 여행도 인기를 끌었다.
이 책은 역사를 기술한 ‘교양서’임에도 술술 읽힌다. 교수 특유의 현학적 문체가 거의 없다는 점도 미덕이지만 무엇보다 당시 ‘그랜드 투어’를 100% 활용하기 위한 여행자들의 고민이 지금 우리의 문제와도 겹치기 때문이다. 그랜드 투어에 공교육 불신,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계층 구조, 과열된 외국어 조기 교육 같은 현재를 투영시켜 보면 결국 역사란 돌고 도는 수레바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건강도 상속도 챙겨준다…‘보증금 3000만원’ 실버타운 가보니 [고령화 투자대응④]](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8/e7b3f20b-7814-49a9-8dca-d6f7cfb4c4c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