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논산시 광석면에서 홍경기씨가 텅 비어 있는 양돈축사를 둘러보고 있다. 홍씨는 20여 년간 돼지를 키웠지만 최근 돼지 값은 폭락하고 사료·분뇨처리비 등이 크게 올라 양돈사업을 포기했다. [논산=프리랜서 김성태]
충남 논산시 광석면에서 홍경기씨가 텅 비어 있는 양돈축사를 둘러보고 있다. 홍씨는 20여 년간 돼지를 키웠지만 최근 돼지 값은 폭락하고 사료·분뇨처리비 등이 크게 올라 양돈사업을 포기했다. [논산=프리랜서 김성태]돼지 가격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면서 양돈을 포기하는 농가가 급증하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1만2000여 가구였던 양돈농가가 지난해는 6000가구로 반 토막이 났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등은 “생산원가에도 크게 못 미치는 현 시세가 계속되면 남은 양돈농가 절반도 파산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하소연이다.
하지만 구제역 파동 이후 2011년 880만 두까지 줄었던 돼지 사육두수는 오히려 늘어 사상 최대치인 1000만 두에 육박하고 있다. 양돈농가는 급감하고 있는데 사육두수는 급증해 돼지 가격이 끝없이 추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년 전 양돈단지로 조성된 충남 논산시 광석면을 지난달 29일 찾았다.
구제역 방역장치가 지키고 선 마을 입구에서 차량 소독을 마치고 양돈단지로 들어섰다. 꿀꿀거리는 돼지 소리를 기대했지만 짙은 안개에 싸인 양돈단지는 여기저기 빈 축사가 방치돼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다. 1993년 조성될 당시 14가구가 3만 두의 돼지를 키웠던 이곳엔 현재 7가구가 기르는 1만5000두 정도만 남아 있다. 지난 연말 키우던 돼지 2200두를 모두 내다팔고 양돈사업을 접었다는 홍경기(76)씨를 따라 불 꺼진 축사 안으로 들어갔다. 컴컴한 축사에선 아직 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우리는 휑하니 비어 있었고 버려진 사료통과 물통만 나뒹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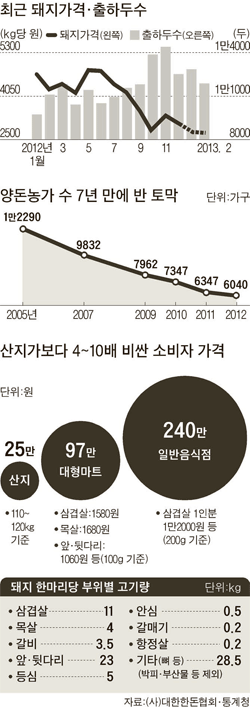
홍씨는 “아들(47)과 함께 둘이 돼지를 키웠는데 한 달에 수백만원씩 적자가 나 버틸 재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야 텃밭이나 일군다지만 빚만 떠안고 실업자가 된 아들을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홍씨의 축사 옆에서 올해 초 사료업체 D사에 돼지 3000두와 축사까지 모두 넘겼다는 정모(37)씨를 만났다. 정씨는 “예나 지금이나 하는 일은 똑같지만 지금은 D사의 월급쟁이로 일하는 위탁농 신세”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농협 대출에 사채까지 끌어 쓰며 버텼지만 돼지를 키워 내다팔수록 빚만 쌓여 양돈사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농가들의 양돈 포기 선언은 한마디로 요즘 돼지 시세가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양돈농가가 시장에 내다파는 규격돈(110~120㎏)의 1월 산지가는 25만원 안팎으로 생산원가 37만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한돈협회 정선현 전무는 “돼지 한 마리를 키워 팔 때마다 양돈농가는 대략 10만원 안팎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돼지 시세가 생산비에도 못 미쳐 대부분의 양돈농가가 빚더미에 앉아 있다”며 “현 시세가 회복되지 않으면 양돈농가의 50% 이상이 도산에 내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5~6월을 기점으로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있는 돼지 가격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예년의 경우 돼지 가격은 여름 휴가철 삼겹살 소비가 늘면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추석 때는 올라가곤 했다. 하지만 최근엔 이 같은 가격 등락 대신 하향곡선만 그리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위험 수위에 이른 공급 과잉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돈협회에 따르면 국내 적정 돼지 사육두수는 대략 900만 두 정도. 하지만 최근 전국의 돼지 사육두수는 991만 두까지 늘어났다. 적정 사육두수를 웃도는 100만 두가 양돈농가엔 재앙이 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소비가 늘면 다행이지만 경기침체까지 겹쳐 지난해 하반기부터 돼지고기 소비는 되레 줄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싼 수입육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지난해에는 예년의 두 배인 42만t의 돼지고기가 수입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돼지 사육두수가 줄기는커녕 계속 느는 이유는 뭘까. 논산의 정씨처럼 개인 양돈농가가 포기한 자리를 사료·육가공·유통 등을 수직 계열화한 식품이나 사료회사들이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의 경우 천안이나 서산 등에 있던 이름 있던 대규모 양돈농가들의 사업권이 최근 사료나 식품회사인 D·H·S 등에 속속 넘어갔다. 익명을 요구한 서산의 S축산 대표는 “3000두 정도를 기르는데 축사 안 돼지가 더 이상 내 돼지가 아니다”며 혀를 찼다. 돼지를 내다팔아도 적자여서 좀 오를까 하며 출하를 늦췄는데 값이 더 떨어져 적자폭이 커졌고, 사료값이나 대출금 등을 갚으려면 양돈사업을 통째로 팔아야 할 처지라는 것이다.
한 사료회사 관계자는 “돼지 가격이 워낙 폭락해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것 같다”며 “하지만 대형업체 역시 사료·육가공·포장판매 등을 일괄 처리해도 비용을 줄이는 것이 어렵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양돈농가들은 “대형업체가 마구잡이로 사육두수를 늘리고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불만이 여전하다. 2010년 구제역 파동 때 피해가 적었던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것도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한 한 원인이다. 양돈농가들의 모임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2010년 구제역 파동 때 일부 지역은 전혀 피해가 없었다”며 “당시 돈을 많이 번 양돈농가들이 암퇘지 수를 대폭 늘렸고 그 물량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돈농가들은 돼지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암퇘지 수를 줄이고 지역별로 사육두수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돼지고기 가격을 회복시키는 데는 소비가 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한돈협회 최성현 부장은 “국내 소비자는 돼지 한 마리당 10%도 안 나오는 삼겹살만 먹으려 한다”며 “영양가가 더 많은 안심·등심이나 앞·뒷다리 등의 소비가 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마트에서 지난해 판매된 돼지고기 중 70%가량이 삼겹살이다.
또 돼지고기 소비 증가를 가로막는 복잡한 유통단계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형마트나 일반 식당에서 팔리는 돼지고기를 돼지 한 마리로 환산하면 대략 97만~240만원에 해당한다. 산지가가 25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가는 4배에서 최고 10배까지 뛰는 것이다. 한돈협회 정선현 전무는 “산지가는 지난여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특히 일반 식당의 삼겹살 값은 ‘1인분(200g) 1만2000원’이 요지부동”이라며 “산지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삼겹살 값은 어떻게 1년 내내 똑같은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돈자조금위원회는 또 “지난해 수입육 수입이 두 배가량 늘었는데 시중에서 수입육을 판다는 음식점은 거의 없다”며 “당국이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산=장정훈 기자
사진=프리랜서 김성태


![[오늘의 운세] 4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