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도쿄의 전자상가 밀집지역에서 한 행인이 샤프의 TV 제품을 바라보고 있다. 샤프는 퀄컴에 최대주주 자리를 내주기로 합의했다. [도쿄 로이터=뉴시스]
4일 도쿄의 전자상가 밀집지역에서 한 행인이 샤프의 TV 제품을 바라보고 있다. 샤프는 퀄컴에 최대주주 자리를 내주기로 합의했다. [도쿄 로이터=뉴시스]일본 대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해 온 일본 기업 특유의 자존심은 버리고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만큼 일본 기업들이 처한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외국자본을 수혈받고, 국내 라이벌 기업끼리 손잡는 경우도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 보도했다.
샤프는 파산 위기에 몰리자 미국 퀄컴에 지분 5%를 내주고 100억 엔(약 1300억원)을 긴급 수혈받기로 4일 합의했다. 이를 통해 샤프와 퀄컴은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시장을 겨낭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퀄컴은 그동안 휴대전화용 마이크로칩 생산과 관련 로열티로 큰 수익을 올렸으나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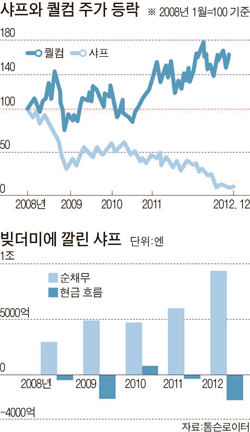
샤프는 이번 제휴에도 불구하고 추가 자금 확보가 절실하다.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로 순현금자산(FCF)이 마이너스 1500억 엔을 기록하면서 한 푼의 현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다. 이를 위해 샤프는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IT) 업체인 델·인텔 등과도 접촉해 자본참여를 타진 중이라고 FT가 전했다. 또 대만의 대형 전자부품 업체인 훙하이(鴻海)그룹과도 제휴를 모색 중이다. 훙하이는 샤프로부터 중소형 액정 사업과 일부 공장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자본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전기·전자업체들은 그동안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해 국내에서 뭉친 적은 있지만 외국 자본을 끌어들인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사정이 다급해지자 대만·미국 기업을 상대로 구애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소니도 핵심전략 부문이었던 전지 사업을 훙하이에 넘기기로 했다. 1991년 세계 최초로 실용화한 리듐이온전지를 상용화했으나 삼성DSI와 LG화학에 밀려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소니는 앞으로는 화상센서 등 ‘이미징’ 기술, 휴대단말, 게임 등 3개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마지막 보루인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 ‘구출 작전’에는 일본 제조업이 거국적으로 나섰다. 르네사스는 NEC·미쓰비시(三菱)전기·히타치(日立)제작소가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을 생존시키기 위해 2010년 4월 출범시켰지만 결국 경쟁력을 갖지 못해 도산 위기에 몰렸다. 그러자 도요타자동차·파나소닉 등 일본 대형 기업들이 일본 제조업 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 르네사스에 1000억 엔(약 1조5000억원)을 출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중공업 부문에서도 생존을 위한 제휴가 벌어졌다. 일본 국내에서 강력한 라이벌인 미쓰비스중공업·히타치는 첨단 화력발전 설비 시장에서 손을 잡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때 방사능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화력발전소 건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30년까지 이 시장 규모는 130조 엔(약 150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 시장을 놓고 일본의 라이벌 기업들이 힘을 합쳐 미국의 GE 등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건강도 상속도 챙겨준다…‘보증금 3000만원’ 실버타운 가보니 [고령화 투자대응④]](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8/e7b3f20b-7814-49a9-8dca-d6f7cfb4c4c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